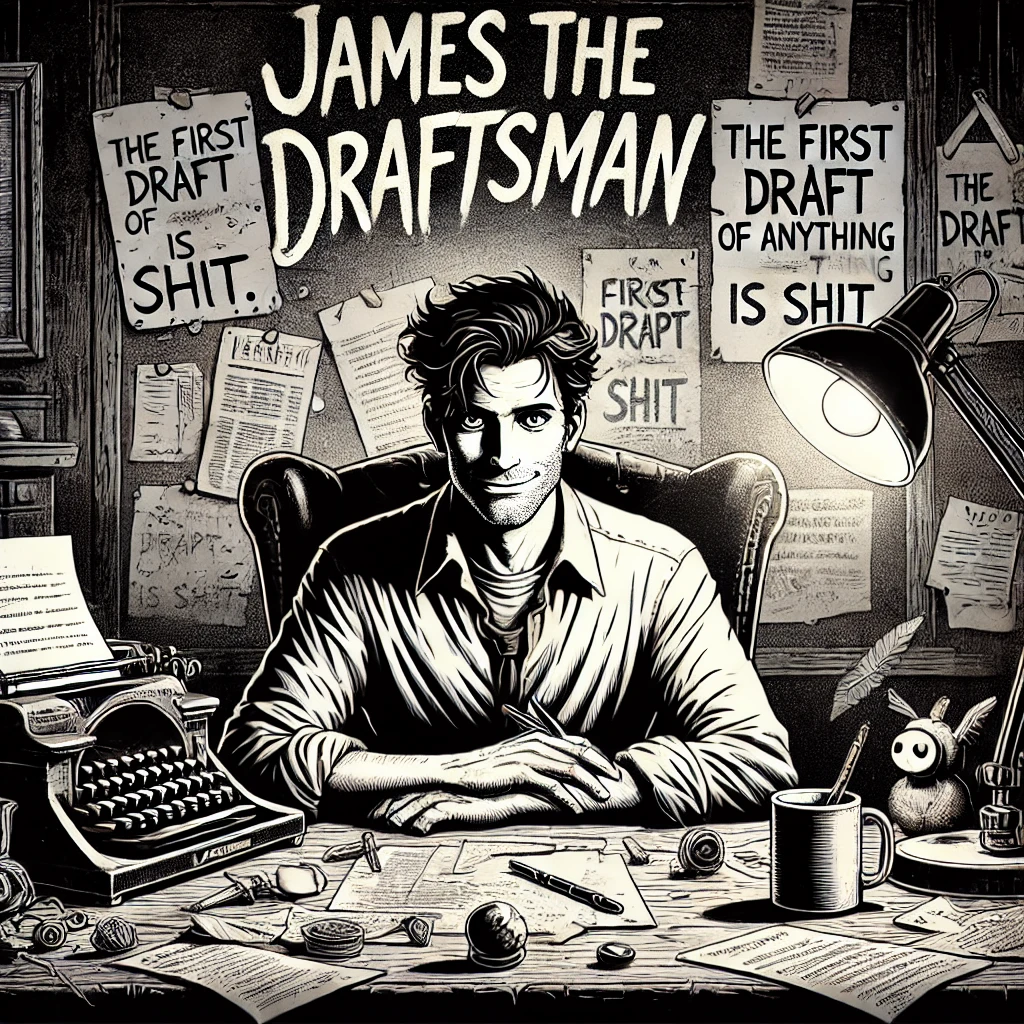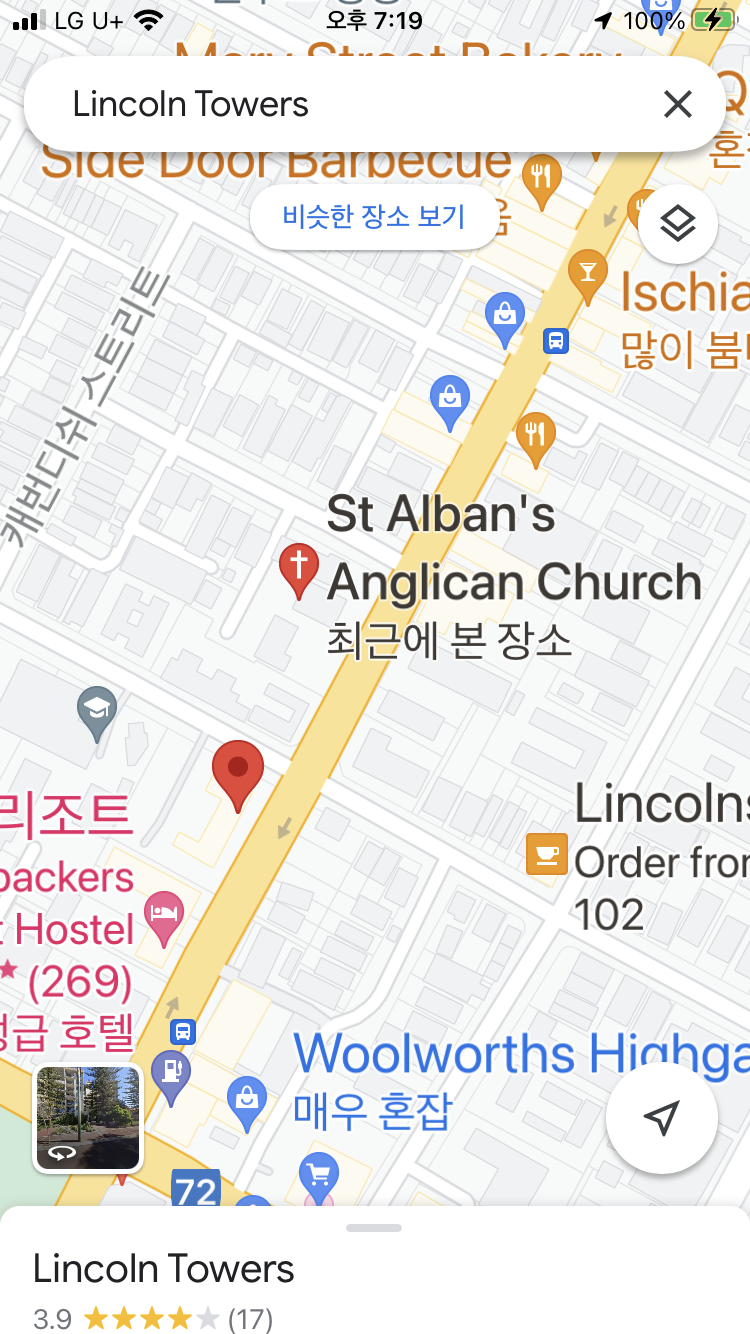글이 자꾸 반복된다. 그래도 계속 서론을 잡고자 한다. 앞서 말했지만, 영주권을 노리고 밴쿠버에 갔다. 하지만 어학연수라는 추억팔이로 글을 써 내려간다. 오늘은, 어쩌면 건강 카테고리에 어울릴만한 이야기를 꺼내본다. 밴쿠버에서 헬스장 다닌 이야기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 사실 좀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구글의 힘을 빌려,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기록과 사진을 다 지워버리는, Alzheimer 같은 인생이다. 비하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호주에서 아주 기름지게 일하고, 먹고, 운동하다 보니 건강한 돼지가 되어 밴쿠버에 도착했다. 당연히 은행계좌를 계설 하고, 그다음 어학원을 다녔다. 그 이후에 헬스장을 다녔던 것으로 추정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일단, 헬스장을 등록하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