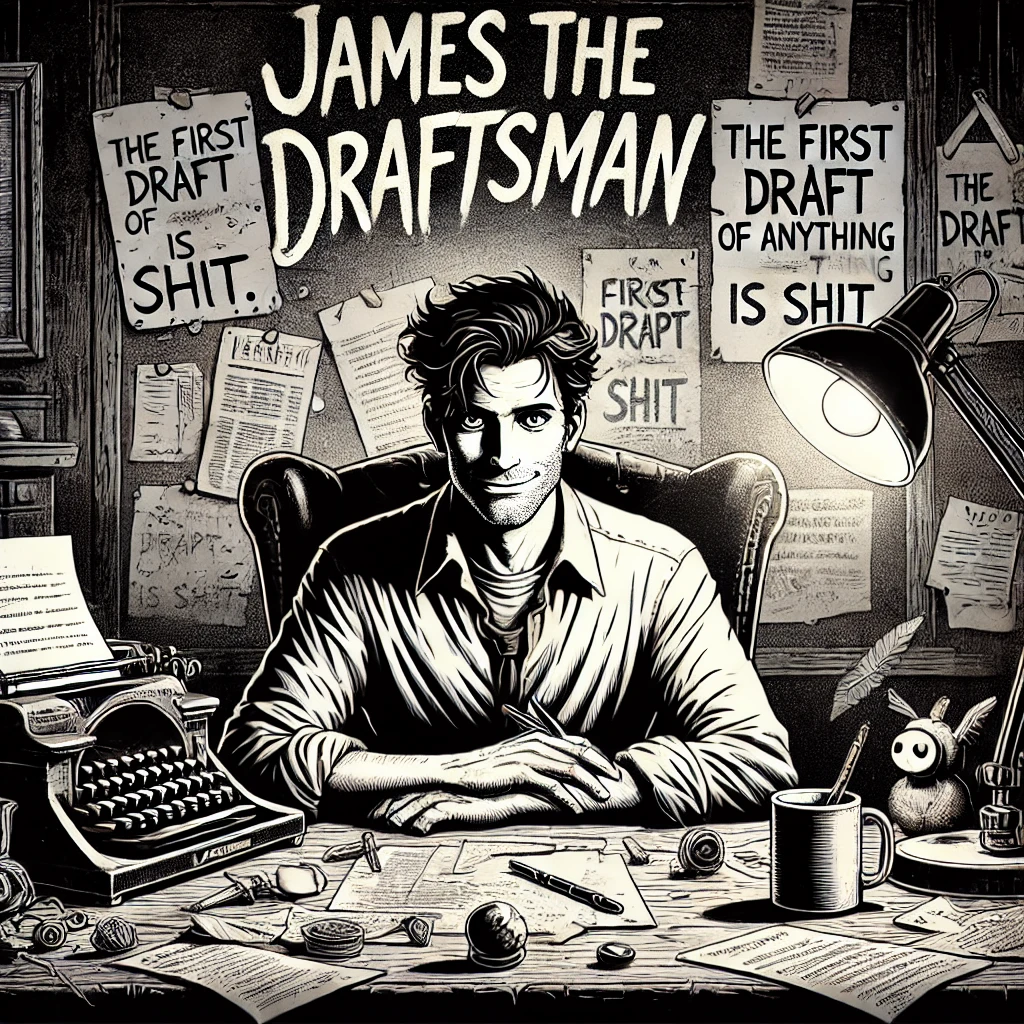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원저를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접한 이유는 킬리언 머피란 배우때문이다. 그렇게 알게된 클레어 키건의 작품, 이번에는 작가의 다른 작품, 맡겨진 소녀에 대해 읽었다. 이야기는 평이하면서도, 주인공 소녀의 성숙하고 속깊은 캐릭터를 잘 그려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내가 새벽에 약간 비몽사몽을 들어서 제대로 들었다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하다.
19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시대상은, 다산이 장려되었던 것인지 5번째 자식인 아들이 태어남에 주인공 소녀는 먼 친척에게 잠시 맡겨진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소녀에게 학대가 벌어지가 하는 전개를 예상했는데, 정 반대였다. 자식이 많다보니 자신에게 제대로 신경써줄 수 없는 부모에 열악한 환경과 달리, 잠시 맡겨진 그곳에선 부모와 같은 따스함을 친척 부부에게서 받는다. 제대로 말하는 법도 몰랐던, 그런 소녀가 글과 책을 제대로 읽고 쓰면서 성장한다.
그런 그녀가 친척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추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더기같은 자신의 옷 대신 입었던 남자아이의 옷, 그 옷의 주인이던 소년의 안타까움 죽음이란 어둠이 그들의 친절 뒷편에 있던 것이다. 물론 소녀를 대체물로 본다던가, 집착하고 빼앗는 시나리오는 아니니 안심하자. 클레어키건은 이러한 소설 속 내용을 은은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이 소설이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 잘 몰랐다. 마지막의 옮긴이의 말이 아니었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에 친척과 헤어지고 원 가족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압권이다. 나는 부모와 아저씨를 혼재하게 불러서, 지금 누가 누굴 부르고 있는지 헷갈렸다. 마지막에 아저씨의 품에 안겨 아빠를 부르는 장면, 옮긴이의 해석을 듣고 나서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사로 파악했다. 이런 소설맹. 그동안 맡겨진 소녀에게 따스함과 성숙함을 준 아저씨와의 헤어짐에서 아빠가 다가옴을 알림과 동시에,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듯한 그 암시가 이 소설의 대미를 장식해준다.
사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정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정과 가족애가 섞여있는 그런 애정말이다. 물론 그런 끈끈함이 찰나일지라도, 소중한 경험이다. 어린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다면 참 축복일 것이다. 원가족이 평안하다면 더할나위 없지만, 때론 남보다 못한게 가족이지 않은가.
'책 그리고 흔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93 기존의 틀을 깨려면 하루 한장 니체 아포리즘 찜 (0) | 2025.01.25 |
|---|---|
| 듣게된 책 탕비실 이미예 (0) | 2025.01.25 |
| 이기주 언어의 온도 선을 긋는 일 (0) | 2025.01.24 |
| 쓸데없는 걸 알면서도 물건 사는 이유 디드로 효과 (0) | 2025.01.24 |
| 192 선물 같은 시간 하루 한장 니체 아포리즘 (0) |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