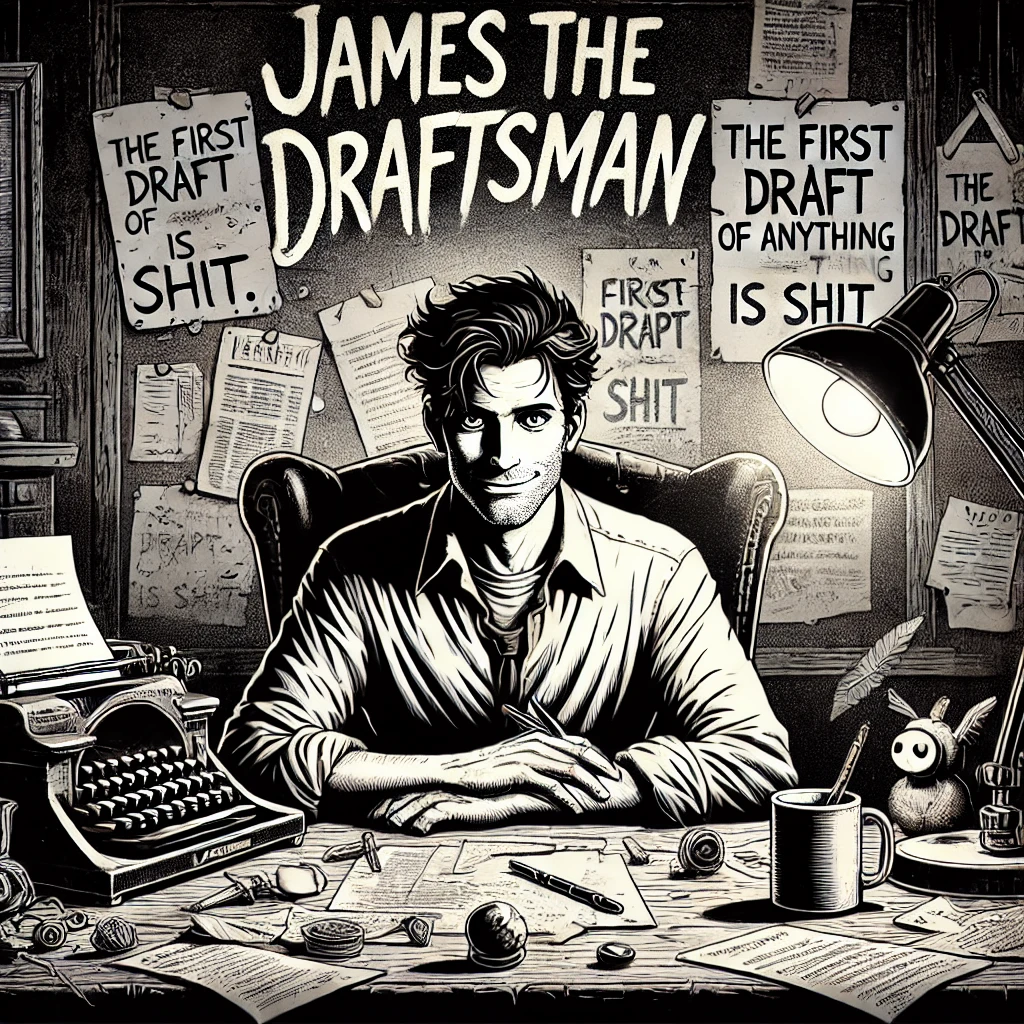나는 제주에 사는 30대 요양보호사다. 제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는 4년이 넘었고, 퍼스에서는 6개월 동안, Carer로 지냈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퍼스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김없이 오늘도 "요양사!!"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몸은 어르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르신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다시 업무를 수행했다. 그 와중에 Belmont nursing home에서의 추억이 떠올랐다. 독일에서 온 1세대 이민자, 프란츠 이야기다. 아시다시피 영어권에서는 나이의 고하를 떠나 서로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프란츠 라 하겠다.

프란츠는 영어를 잊은 전형적인 Dementia 환자였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독일어로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Carer!!"를 외쳤다. 프란츠는 콜벨을 누르지 않았다. 목청 높여 우리를 찾았다. 야간근무 때 우리는 프란츠가 얌전히 잠들긴 바랐다. 앞서 말했듯이, 프란츠는 Carer를 불렀다. 밤이고 낮이고.
프란츠의 혼란 증상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어르신이 부르면 당연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더 큰 문제는, 프란츠가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나오는 행동이다. 프란츠가 보행기구를 끌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간혹 보행기구 없이 걸어 나오는 행동을 해서, 우리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일을 했었다.
나는 독일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프란츠를 더 기억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독일어로 "How are you?"가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봤다. 그렇게 커닝(?) 하고 최대한 발음을 굴려서 "Wie geht es innen?"이라고 말해봤다. 대답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sehr gut 은 들렸던 거 같다.

프란츠가 영어를 잊었지만,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자신이 Boxer 였다고 했다. 보통 프란츠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다 보면,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내가 때렸다기보다, 거의 맞기 직전까지 가곤 한다. 그때마다 권투 동작을 하며 자신이 Boxer 였다며, 영어로 말하곤 했다. 그래서 진짜 프란츠가 권투선수였나 싶었다. 체구는 작았는데, 페더급 체급인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뭐 한국의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퍼스의 요양원도 어르신의 가족들이 방문한다. 이제 내가 다녔던 Belmont nursing home 에는 dining room이 따로 있었다. 우연한 기회의 프란츠의 방에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마주쳤다. 나야 뭐 요양사니까 되지도 않는 영어로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 대화도 짤막하게 나누고, 궁금해서 예전 직업이 권투 선수였는지 물었는데, 이발사였다고 하더라. 프란츠가 취미로 권투를 했다는 걸 잘못 이해했나 싶었다. 분명히 Boxer라고 했는데, 취미였으면 Boxing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존 영어의 한계라서 어휘로만 판단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콜벨과 요양사를 외치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인다. 한편으로 프란츠가 떠오르곤 한다. 지금은 어떻게 지낼지, 아마 이미 떠나진 않았을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그문트, 해리, 이름을 까먹은 건장한 오지 어르신, 그리고 철도기관사 출신의 오지 어르신 이야기를 묶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기록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최대한 나의 기억을 쥐어 짜내어 글을 써 보고자 한다.
'짧지만, 길었던 해외생활..그 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퍼스 안 네팔 홈스테이(?), 음식 (0) | 2022.01.31 |
|---|---|
| 네팔부부와의 우연한, 그리고 소중한 만남의 시작 (0) | 2022.01.30 |
| 밴쿠버, 어학원도 다니고 헬스장도 가고? (0) | 2022.01.22 |
| 워홀러 James 밴쿠버 어학연수 ? 영주권 따기 실패! (0) | 2022.01.17 |
| 22-01-14 King James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