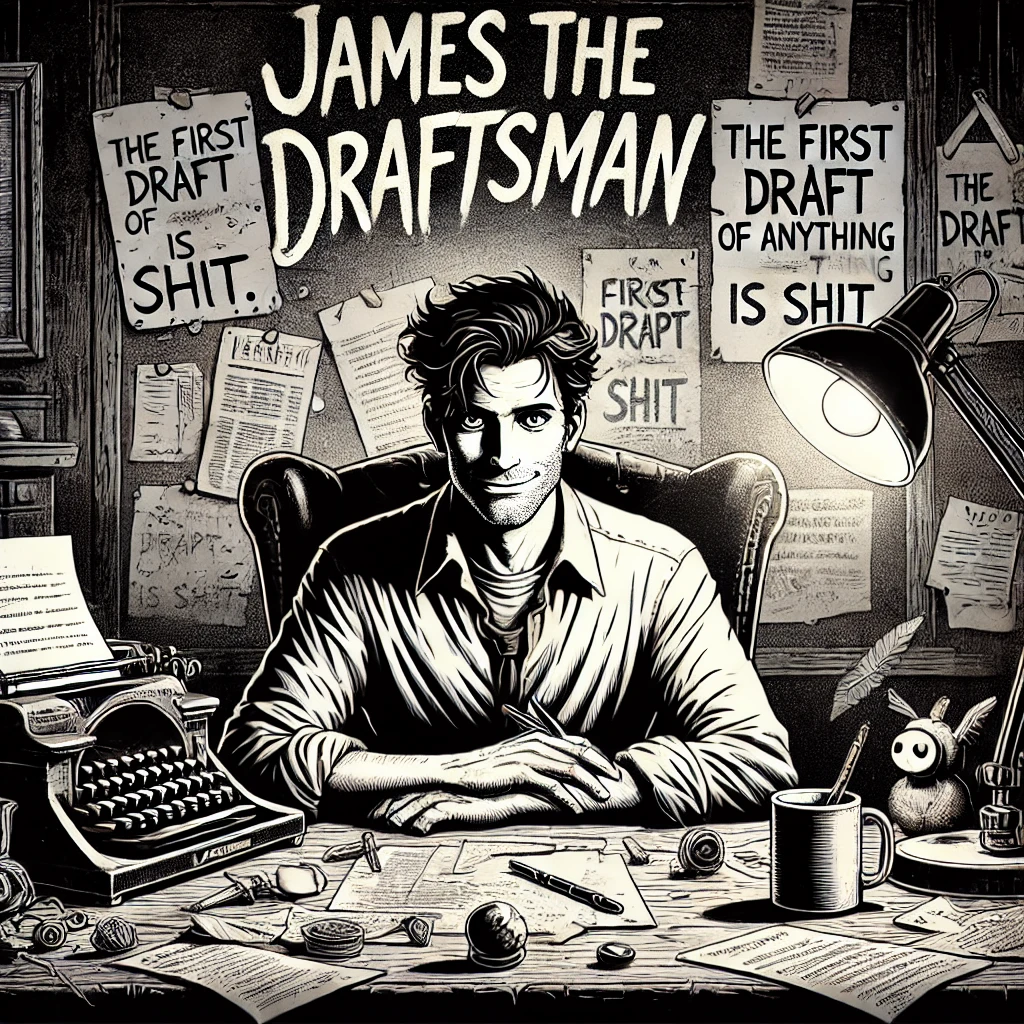글이 자꾸 반복된다. 그래도 계속 서론을 잡고자 한다. 앞서 말했지만, 영주권을 노리고 밴쿠버에 갔다. 하지만 어학연수라는 추억팔이로 글을 써 내려간다. 오늘은, 어쩌면 건강 카테고리에 어울릴만한 이야기를 꺼내본다. 밴쿠버에서 헬스장 다닌 이야기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 사실 좀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구글의 힘을 빌려,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기록과 사진을 다 지워버리는, Alzheimer 같은 인생이다. 비하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호주에서 아주 기름지게 일하고, 먹고, 운동하다 보니 건강한 돼지가 되어 밴쿠버에 도착했다. 당연히 은행계좌를 계설 하고, 그다음 어학원을 다녔다. 그 이후에 헬스장을 다녔던 것으로 추정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일단, 헬스장을 등록하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중간에 은행에 관한 이야기도 곁다리로 넣어보고자 한다.

2016년 당시, 나는 밴쿠버 다운타운 소재의 777 Cadero st에 살았다. 헬스장은 일단 무조건 거주지와 가까워야 한다. 그래야 귀차니즘을 뚫고, 몸의 지방을 덜어낼 수 있다. 그때 영주권을 준비하는 마음이었고, 관광비자 상태였지만, 밴쿠버 라이프를 꿈꿨기에, 무료 체험 생략하고 바로 등록했었다. 내 기억에는, 당시 한 달 헬스장 비용이 50 캐나다 달러였다. 2022년, Robert lee YM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성인 기준 2주에 25.99불이었다.
보통 어학연수로 온 친구들의 경우 헬스장을 다닐 생각은 잘 안 하게 된다. 자동이체를 해야 하니 중간에 해지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해지할 때 위약금은 따로 없었다. 시설도 괜찮고, 특히 헬창들에게는 훌륭한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그곳이 밴쿠버 헬창 집합소라는 점이다. 자리싸움이 치열하니까 각오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트랩바를 이용해 데드리프트를 했었다. 헬창들 사이에서, 다이어터가 나름 현명하게 운동 루틴을 가져가는 방법이다.

내가 상당한 길치라서, 구글을 통해서 헬스장을 다니던 기억이 난다. 이제 Burrad st와 Robson st가 교차하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헬스장을 가곤 했다. 그런데, 본인이 약간 찐다 감성이 있어서, Robson st로 잘 안 다니게 되었다. 약간 번화가여서 식당이나 호텔 등 사람들이 꽤 붐비는 거리였다. 나중에는 뭐 burrad st로 갔다가 haro st로 빠지고 했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헬스장을 가곤 했다.

밴쿠버의 타 헬스장의 방침은 잘 모른다. 다만 내가 다녔던 YMCA 헬스장의 경우, 은행계좌를 증명해야 한다. 헬스장은 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 증명에 관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야 한다. 호주 워홀로 생존 영어를 했지만, 눈치껏 알아듣는 척하는 영어 수준인지라 아무튼 제일 큰 BMO burrad st 지점으로 갔었다. 위의 사진이 BMO burrad 지점이고, burrad 역이 있는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burrad st를 기준점으로 잡고 걸어가면 금방 찾아간다. 참고로 나와 같은 길치는, 구글맵을 계속 확인하고 걸어야 한다.
사족으로, 위의 사진에 보면 Cactus Club 카페 어쩌고 하는 장소가 보인다. 거기서,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다. BMO 지점을 구글링 하다 보니 추억이 떠올라서 덧붙어 보았다. 추억 돋네. 나중에 은행계좌를 만든 이야기도 풀어보겠다. 오늘은 헬스장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니까, 다시 추억의 헬스장 이야기로 돌아간다.
내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근력운동을 나름 간헐적으로 했다. 했다 말았다 하다 보니, 마음은 헬창인데, 몸은 그냥 마른 비만이 되었다. 퍼스나 밴쿠버에서 운동할 때, 딱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 딱히 관심들이 없다. 요즘 한국의 헬스장도 PT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딱히 옆에서 티칭 하려는 아저씨들이 사라졌다. 나같이 운동신경이 없는 친구들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다.
어학원을 다니면서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 어학원에서 안면이 있는 친구들을 종종 마주치곤 했다. 기억에 남는 친구는 콜롬비아에서 온 20대 청년 헬창 산티아고다. 내 영어 이름은 James인데, 스페인에선 제임스가 산티아고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다. 확실히 유전자가 다른지, 삼각근부터가 남다른 친구였다. 부러운 마음도 들고, 흘깃 쳐다보고 그랬다. 그날도 그냥 트랩바를 들어 올리면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산티아고가 먼저 다가와서, 운동 열심히 한다며 대화를 걸었던 기억이 난다. 괜스레 헬창 산티아고를 기억하고 있다. 뭐하고 사나, 부러운 몸이었는데 참.

나를 호주와 캐나다 추노의 삶으로 이끌어줬던 친구랑도 케틀벨 스윙으로 몸을 조진 기억이 난다. 물론 그 친구는 하다가 말았다. 그리고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trial 기간이 있어서 같은 어학원 친구들과 줌바와 요가 클래스를 들었던 기억이 살짝 난다. 다신 할 생각은 없다. 야매 수영을 배운 경험이 있어서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수영도 하고, 자쿠지도 이용했던 기억과 함께, 추억의 밴쿠버 헬스장 이야기는 마무리한다.
어학연수를 보통 6개월 정도 오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YMCA 헬스장도 추천한다. 아니면 아파트 내의 헬스시설이 있는 곳으로 잡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건강과 어학실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물론 방구석에서 추억을 쌓는 입장이라 설득력은 떨어진다. 알고 있으나, 아무튼 마무리.
'짧지만, 길었던 해외생활..그 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네팔부부와의 우연한, 그리고 소중한 만남의 시작 (0) | 2022.01.30 |
|---|---|
| 요양사!! Carer!! (1) | 2022.01.26 |
| 워홀러 James 밴쿠버 어학연수 ? 영주권 따기 실패! (0) | 2022.01.17 |
| 22-01-14 King James (0) | 2022.01.14 |
| 22-01-11 나이 27살에 해외로 추노했었다. 질문받는다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