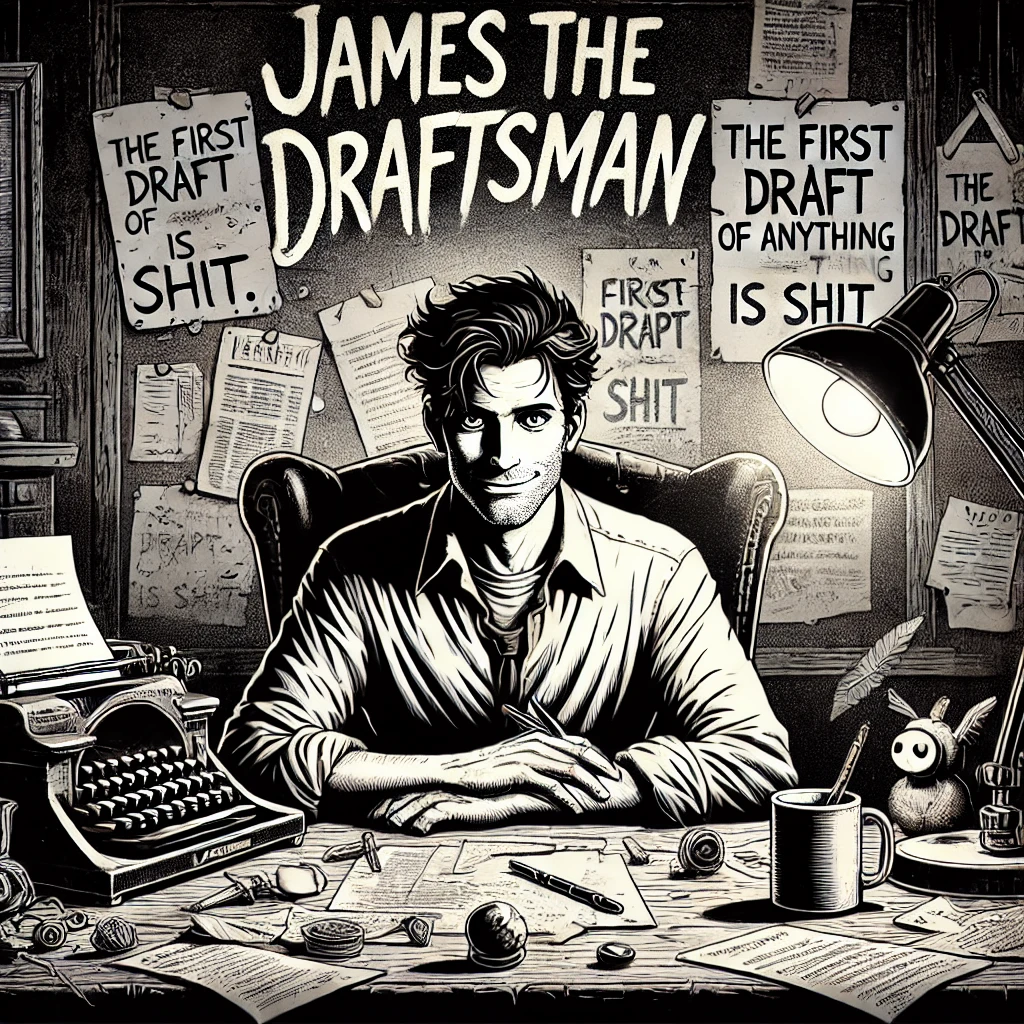단편으로 글쓰기를 연명하는 삶이다. 김동식 작가는 단편소설로 유명한 걸로 보인다. 소설맹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회색인간이란 제목의 단편모음집, 그 첫 작품이 바로 회색인간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 떠올랐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사실 비슷한 장면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문화가 살아남아 있었단 점이다. 그안에서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빅터는 의미부여를 했다.
회색인간도 지저인간에 의해 갑자기 노예같은 삶을 살게된 인간들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그들도 처음엔 저항하다 만명에서 절반 이하가 된 생존자들이 체념한체 강제노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미 시체가 굴러다니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반쯤은 좀비나 나름없는 상태가 되어 살아간다.
그러던 중 노래부르다 쳐 맞는 여인이 등장한다. 맞은 이유가 노래를 불러서, 그래도 또 부르고 돌을 맞고 또 다시 부른다. 그렇게 예술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노래 부르는 여인이 생겼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 등장한다. 이 청년도 미친놈 취급을 받지만, 한 노인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주길, 그러면서 빵을 주기 시작한다. 이 모습에 한 청년이 자신은 소설가였다고 말하고 주절거린다. 중년여인이 날이선 모습으로 청년에 몰아세운다. 청년은 그 자리에 중년의 여인에게 어떤 한 이야기를 만든다.

마치 소설가의 눈으로 여인을 꿰뚫었고 중년 여인은 마치 이 청년의 후원이 되었다. 처참한 회색인간들의 삶에서 후원이라고 해봐야 빵이지만, 여기서는 생명은 나누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후원인과 예술가의 관계가 성립했다 표현할 만 하다. 이렇게 예술이 부활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이 지저인간에 대한 알수없는 폭력에 대해 견디어 낸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견뎌낼 이유가 생긴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여전히 사람들은 배가 고팠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
'책 그리고 흔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경리, 4부 까치설 <모순> (0) | 2024.10.27 |
|---|---|
| 112 청년을 망치는 것, 하루 한장 니체 아포리즘 (2) | 2024.10.27 |
| 박경리, 4부 까치설 <소문> (1) | 2024.10.26 |
| 111 오만함, 하루 한장 니체 아포리즘 (0) | 2024.10.26 |
| 알퐁스 도데 단편, 월요일 이야기 <팔 집> (0)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