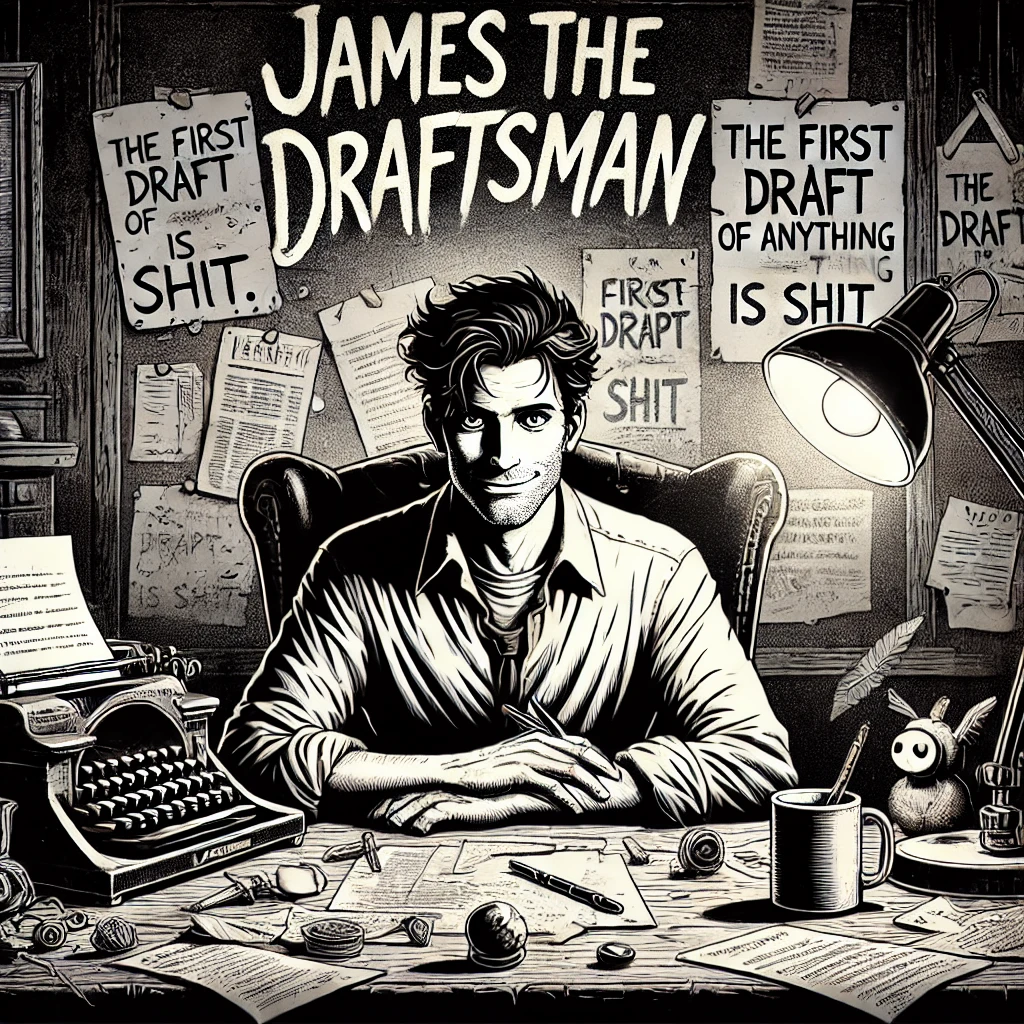무엇인가 기대를 갖는 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어릴때야 뭐 오늘은 혹시 100원이라도 생기려나 아니면 천원이나 생기면 어쩌지 하는 기대감이 하루를 설레게 만들기도 했다. 어린시절에 100원 만 있어도 50원짜리 사탕이 두개, 오락 한판 정도도 가능하고 천원은 이에 10배니까 하루를 신나게 보낼 수 있다. 지금이야 만원이 생겨도 밥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갖는 삶을 하루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항상 어느정도의 기대를 갖고 살던 시간이 있었다. 대체로 그 시기가 한국나이 30이 되기 직전까지 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10대는 단순하게 아까와 같이 용돈이나 게임같은 단순욕구를 충족하는 기대도 있었고, 진학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노력했었다. 기대란 것은 단순히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길 바라는 미련함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바라는 감정에 가깝다.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노력보다 좀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좋아 좀더 기분이 좋다. 기대란 것이 다음 행동에 동력이 되는 셈이다.
20대를 돌아보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큰 기대에 부풀어서 산 시절이 아닌가 한느 생각이 든다. 돌이켜보면, 20대의 나는 10대에 이룬 대학생 신분을 갖고 마냥 허세스럽게 살았던것 같다. 남들이 취업을 위해 착실히 노력한 뒤 기대하는 과정을 나는 거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이해도 못하는 주제의 어려운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쓰고, 그런 내 자신을 말주변으로 지적 허영을 포장했다. 주변에서는 아마 비웃었을 것이다. 남들은 죽어라 취업준비 해도 기업체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난 백면서생 마냥 좋아함을 핑계삼아 배짱이 같은 대학생활을 보냈다.
결과는 서울생활의 중도포기, 대학을 중퇴(제적은 캐나다에 있을때 확정)하고 호주로 도망치듯이 날아갔다. 20대의 대학생때 가진 막연한 기대감은 처참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그래도 이때는 다른 기대감으로 나자신을 채워나갔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영주비자를 받아서 호주, 나중에는 캐나다의 시민으로 살기를 기대했다. 열심히만 살면, 버티기만 하면, 그 나라의 최저의 계급만 자처하면 언젠가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정 꼴이 부끄러우면 한인사회에 낄 생각 말고 난 아시안이다 마인드로 어우어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보내는 시선보다는 덜 차가우니까 말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려놓은 기대마저 철저하게 박살났지만 말이다.
제주로 돌아오고 오늘날까지 이제는 기대하고 사는 삶은 없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데 기대가 작아져도 결과가 처절하면 실망하는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다. 기대의 크기와 실망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기대자체가 있으면 결국 실망감은 극적으로 다가오고, 아직 느끼지 못했지만 절망감으로 이어진다. 만약 내가 절망감을 느꼈다면, 여기다가 글을 쓰고 있지 않고 내손에 아마 다른 게 쥐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요즘 내가 다시 작은 기대를 품는 것은, 세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다. 일단 예전의 취미였던 책을 다시 읽는점, 글을 쓰고, 말을 다시 남기는 활동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정량적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가령 책을 뭐 한달의 몇권 혹은 어떤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한다던가, 글을 쓰는 수준이나 말을 얼마나 조리있게 하느냐를 기준삼지 않는다. 정성적인 평가기준 단 하나,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를 보고있다.
위의 기대를 갖기엔 아직 2달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적극적으로 시작했다고 치면 1달이 될까 말까 하다. 최소 6개월을 유지하면 그나마 덜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올해를 넘기면 그나마 한숨 돌릴정도의 결과는 되어 보인다. 이번에는 좀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싶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게 아니라 이제라도 오늘의 나에게 실망을 덜 하고 싶을 다름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게 두렵지 않게 말이다.
'일상 끄적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6-04 오늘의 구절 (0) | 2024.06.04 |
|---|---|
| 셋 중 한명은 고독사 걱정, 마처세대? (1) | 2024.06.03 |
| 여아를 1년 일찍 입학시키고, 노인은 해외로 보낸다 (0) | 2024.06.03 |
| 2024-06-03 오늘의 구절 (0) | 2024.06.03 |
| 말과 글로 흔적을 남긴다...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