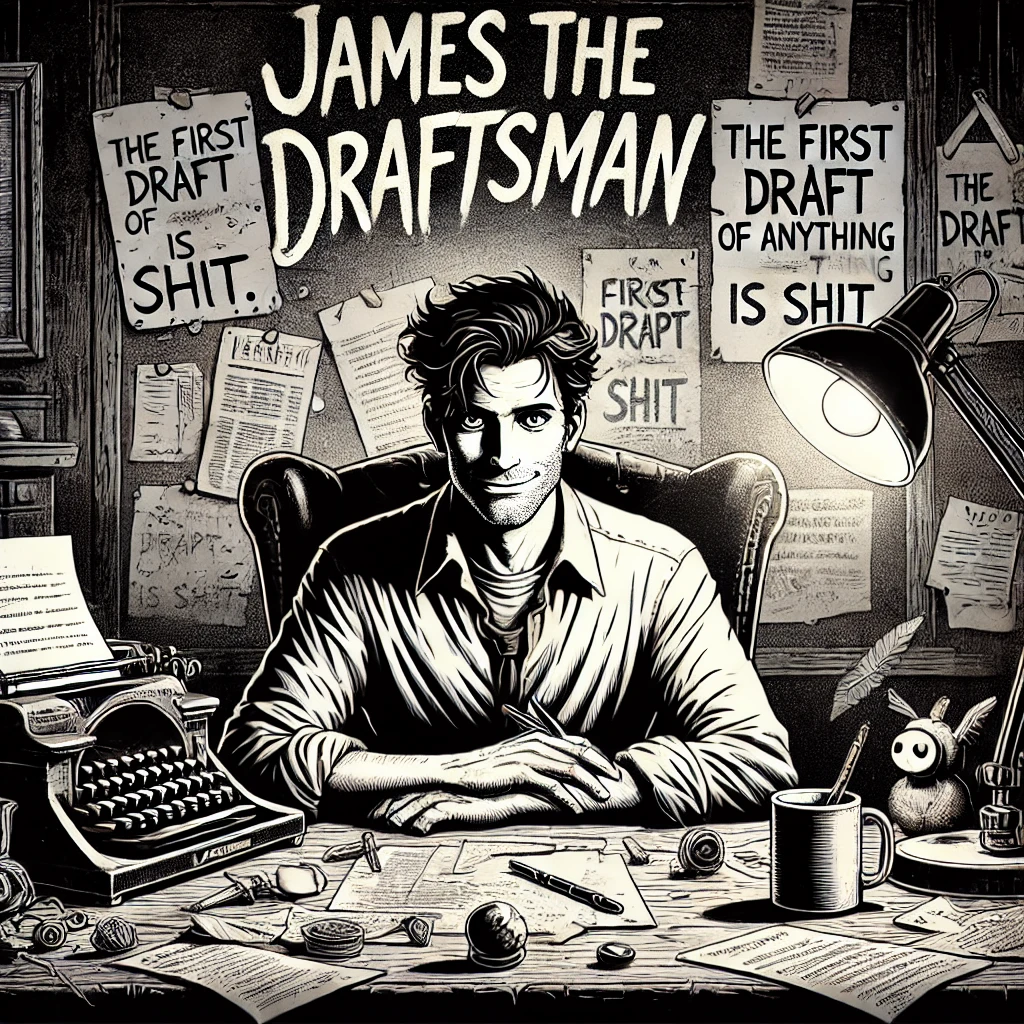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623
1년 반 동안 불꺼진 제주칼호텔...원도심 상권도 '깜깜' - 제주일보
제주관광의 상징이었던 제주칼호텔이 문을 닫은 지 1년 반이 지나도 새 주인이 나오지 않아 이도1동 원도심 상권이 침체에 빠졌다.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 온 김모씨(64)는 “지난해 4월 30
www.jejunews.com
22년 4월 30일, 제주 칼호텔이 영업을 종료했다. 한진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칼호텔네트워크 산하의 호텔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제주 칼호텔, 허나 현재 매각은 지연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스산한 분위기의 칼호텔이 덩그러니 있는게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집근처 사거리에 칼호텔이 있다보니 볼때마다 뭔가 썰렁한 기운이 전해진다. 제주에서 가장 높았던, 제주의 랜드마크가 이제는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다.
매각을 결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투자자가 950억을 제안했다. 그때가 22년 8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공매입으로 687억을 제안해서 도민을 위한 워케이션센터를 구상했다. 허나 950억을 제안한 민간투자업체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자며 덤벼들었고, 자본이 이겼다. 문제는 잔금 855억을 1년간 지급하지 못한다. PF 사태로 한창 시끄럽던 터라 유동성 문제로 민간업체는 자금확보에 실패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방치된 채로 칼호텔, 민간업체와의 매각은 23년 7월 28일에 결렬된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073
제주 원도심 칼호텔 2년째 방치 ‘매달 관리비만 6000만원’ - 제주의소리
지난 40년간 제주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제주칼(KAL)호텔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송사까지 휩싸이면서 당분간 매각 재추진도 어려워졌다.21일 한진그룹 산하 한진칼은 사업보고서를
www.jejusori.net
해당 기사는 24년 3월 21일자 기사로, 혀전히 방치된 칼호텔에 대한 이야기다.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원도심에 방치된 칼호텔로 주변 상권은 침체되고, 매달 6천만원의 관리비가 칼호텔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칼호텔의 관리비 적자는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업이익으로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칼호텔 주변의 상인과, 예전 칼호텔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어떨까.
22년에 칼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190명의 직원 중 107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73명은 서귀포 칼호텔에 이직했다고 한다. 그러면 10명의 근로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이 간다. 서귀포에 간 직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근로자는 다시 새로운 일을 찾는데 많이 애를 썼을 것이다. 제주도 특성한 일자리도 많지 않고, 칼호텔에 오래 일한 경력을 살릴 만한 일자리는 더더욱 적다.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먹는게 쉬운일은 아니지 않은가.
칼호텔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었다고 하기엔, 사실 동내 주민입장에서 약간 반론을 감히 해보고 싶긴 하다. 칼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은 관광객이고 주변 상권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다. 식당들도 주변 직장인이나 동네 혹은 도민들의 맛집 정도 일 것이고, 두개의 예식장은 칼호텔 영업과 무관하니 말이다. 칼호텔 관광객이 근처 삼성혈 관광이라도 하려나. 칼호텔이 차지하는 주변 상권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허나 운영하지 않는 거대한 랜드마크가 방치된 부분은 어느정도 영업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긴 하겠다.
몇몇 시사를 보면 칼호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JDC가 본사이전하면서 고려하는 부지중에 칼호텔이 있다는 기사도 있다. 이것도 논의 단계고, 아무래도 성사되긴 어려운 느낌이 든다. 한 기고문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제안하는데, 솔직히 좀 터무니 없다. 주차문제가 분명 제주 도심에서 문제이긴 하지만, 칼호텔이라는 좋은 입지를 주차를 위한 부지로 써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 차라리 처음 매각에 제안했던 공공입지로 워케이션센터 구상안이 가장 좋아보인다.
나의 부모세대에게 칼호텔은 제주에서 가장 큰 호텔이고 상징이었다. 해당 호텔에 숙박할 일은 없어도, 마음먹고 뷔페를 먹으로 갈 마음은 갖고 있는 제주의 랜드마크였다.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건물은 주인을 찾지못해 썰렁하게 남아있다. 주인을 찾는 동안 매달 6천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호텔건물을 난 매일 보곤한다.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다만 도민이든 근로자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만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랄 뿐이다. 제주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