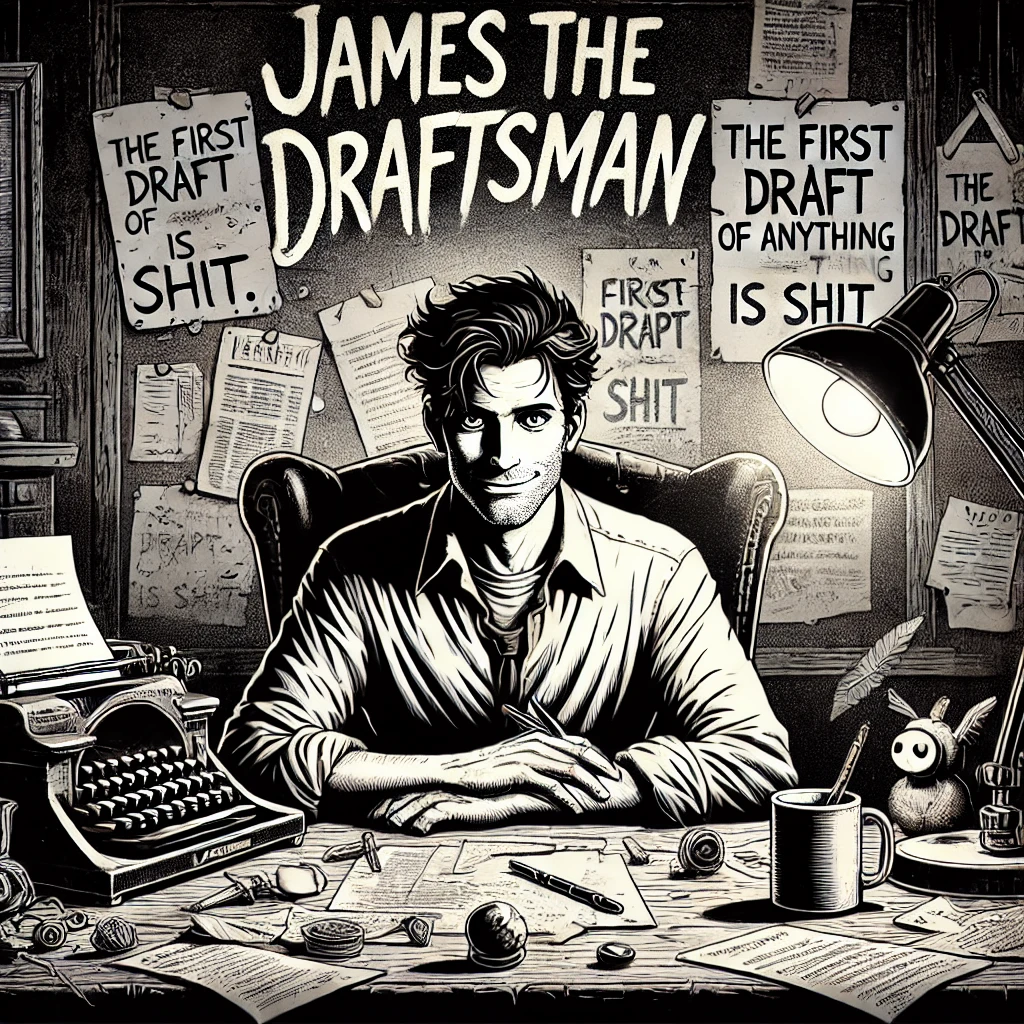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80386&code=61121111&cp=nv
“벨 울리면 불안해” 국적·세대 불문 ‘콜 포비아’ 확산
전화가 오면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명 ‘콜 포비아’(전화공포증)를 겪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는 최근 ‘휴대전화로 전화
www.kmib.co.kr
콜 포비아, 음성통화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 세대를 불문하고 확산된 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져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내용을 국민일보에서 확인했으며, 전화받는걸 두려워하는게 젊은 세대만의 증상이 아닌점이 포인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세대를 불문하고 통화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기사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왠만하면 전화통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다. 메신저로 이미 연락이나 약속을 다 잡게 되니, 약속시간에 안나타는 놈팽이 정도에게 전화하는 경우 외엔 없는거 같다. 그 놈팽이도 한둘이 아니라서 그냥 단톡방으로 말하는게 빠르니 말이다.
전화가 불편한 젊은 세대와 메시지보다 통화버튼에 손이 가던 세대와 차이가 이제는 거의 없나보다. 기사에서는 46세 남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시했지만, 우리의 실 사례 속에서 부모세대는 전화와 메신저 어떤것이 편한지 궁금하긴 하다. 나같은 경우 전화할 일은 거의 없긴하지만, 메시지가 편해도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런데 보통 전화가 스팸이라서 문제지
나에게도 특수한 콜 포비아가 있었던 적이 해외에서의 통화였다. 호주나 캐나다에서 왠만하면 전화통화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면으로 영어를 들을 때와 전화통화는 나에게는 다른 단계였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는 무언가 잘 못알아들어도 상황이나 눈빛, 느낌? 같은 걸로 대충 생존영어로 버티는게 가능하다. 반면, 전화통화는 일종의 수능 영어듣기 상위버전이랄까. 일단 나의 레벨을 배려하지 않는 특유의 어휘나 속도로 전달되는 그 영어메시지는 나를 혼란에 빠트렸다.
내가 워홀러로 한 50군데 요양원에 이력서를 돌려 겨우 한군데 연락이 온 경험이 그 사례다. 전화를 받고, 대충 요양원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요양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요양원 이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나중에 간호사, 우리나라로 치면 나름 수간호사급?)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대화가 끝나버렸다. 다행히 연락처를 구글링해서 요양원과 위치를 알고 찾아갈 수 있었다. 콜포비아의 요양원 입성기였다. 구글과 스마트폰의 발전이 아니었으면 나는 워홀러의 추억을 쌓지 못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그나마 콜포비아를 적당히 극복한 상태였다. 요즘 왠만한 영어권 고객센터는 인도억양의 상담사가 전화를 받는다. 내가 인도를 싫어하지만, 인도억양이 익숙하다. 인도영어 익숙해지면 은근 잘들린다. 원어민들 너무 현란한 혀꼬는 발음을 듣다가, 인도나 동남아권 영어를 들으면 그냥 친근하다. 그래서 다행히 캐나다에서는 콜포비아 이슈가 없었다. 그땐 거의 한인놀이하느라 뭐 영어를 썼었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콜포비아는 전화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신체적인 이상증상까지 동반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전화보다는 메신저가 연락의 대체수단으로 자리잡을 텐데, 뭐 딱히 걱정되진 않는다. 그냥 전화가 주는 낭만은 느낄 뿐이다. 의외의 순간에 전화통화가 되었을 때, 나름 인간적인 목소리가 오고가는 그 느낌이 나름 재미있다. 그냥 가끔, 가끔일 뿐이다. 전화보다 카톡이 먼저 손으로 가는 요즘, 전화를 걸고 싶은 상대가 없긴 하다.
'일상 끄적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믿걸 눈에는 호구가 보인다. (1) | 2024.06.08 |
|---|---|
| 극단주의자간의 대립으로 종전은 요원 (0) | 2024.06.08 |
| 장애인의 생활권, 모두에게 나은 사회 (0) | 2024.06.08 |
| 전화기들면 여포가 되는 고객들 (1) | 2024.06.08 |
| 포로를 대하는 러시아의 자세 (1)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