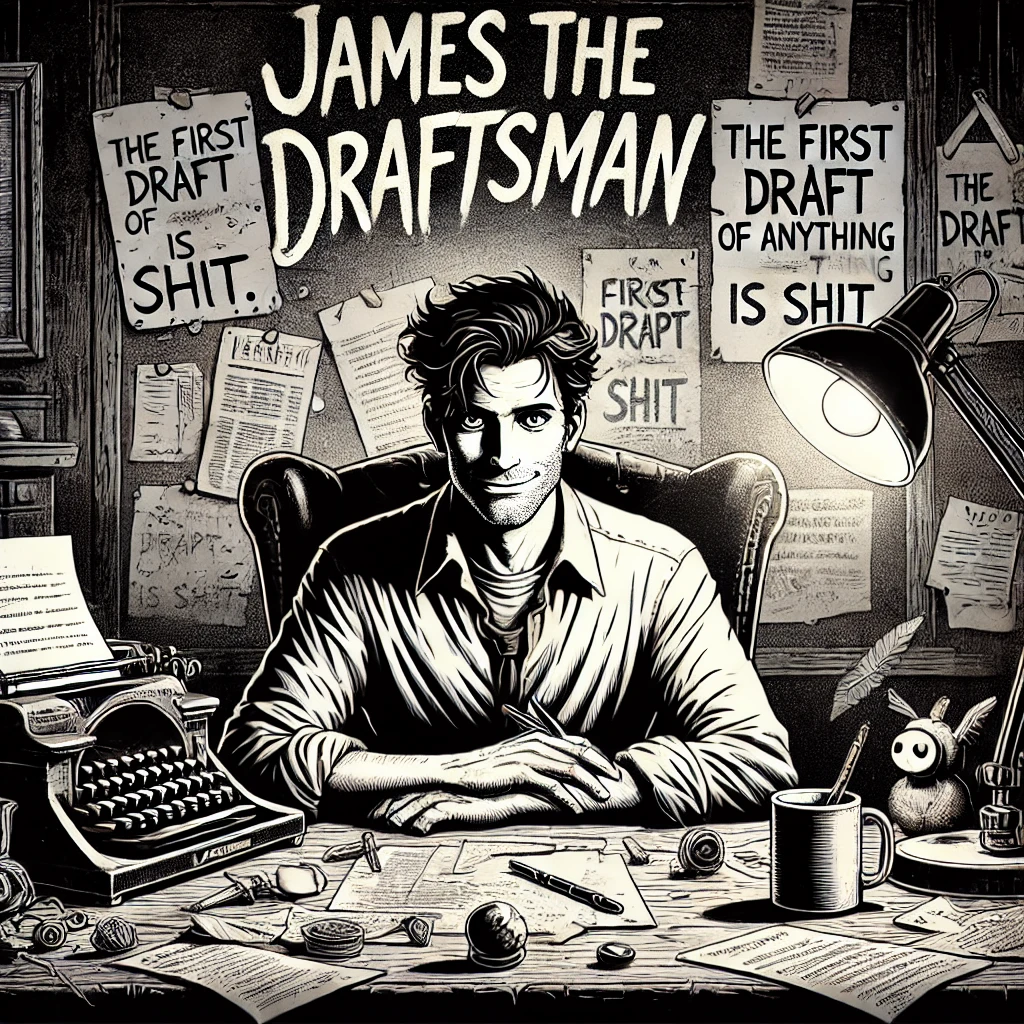데일리 필로소피는 1년 365일 스토아철학의 대표 학자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포리즘을 짜임새 있게 배열한 책이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1년동안 곱씹을 수 있는 책이고, 내 입장에서는 쓰임이 좋은 소재다. 책 한권으로 1년치 글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365 하루 한장 니체 아포리즘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치 스토아철학 아포리즘은 한번에 소화했다. 스토아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인 만큼, 한번에 보는게 맞지 싶어서 결정했다.


사실 지금도 데일리 필로소피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책의 모든 아포리즘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스토아 철학이 주는 가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스토아철학이 가진 금욕과 절제, 이성을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인왕으로 불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남겼다. 명상록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 책을 쓴 이유는 자신의 삶을 스토아철학을 기준으로 항상 수양하기 위함에 있다. 로마라는 제국을 다스리고, 전쟁터에서도 그는 황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로서 살아갔다.
에픽테토스란 인물은 사실 잘 몰랐다. 그가 노예출신임에도 스토아 철학을 다루는데 있어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란 점이 놀랍다. 세네카는 사실 세사람 중 가장 무난하긴 하다. 계급적으로 스토아 철학을 주장하는 인물 중에서 황제와 노예가 금욕과 절제, 이성을 논하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인물이란게, 로마제국은 도대체 어떤 문명이었던 것인가.
한가지 흥미로운 스토아 철학의 생가 혹은 서술방법 중, 어떤 표현은 정결하고 세련되게 하되 욕망과 관련한 것들은 거북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금욕과 절제를 위해 성적인 욕망이나 금전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소위 더럽게 묘사하거나 비유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불쾌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신포도라기 보다는, 해당 욕구에 대해 거리감을 넘어 혐오감을 조성하려는 스스로의 자기통제라고 보여서 독특했다.

위의 내용은 스토아학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해당 철학의 핵심 서술 목적을 보여준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 보다 나에 대한 자기성찰에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나만의 명상록을 작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의 내용이 앞서 언급한 스토아철학이 욕망을 혐오스럽게 거북하게 서술하는 전락이다. 따라하긴 어렵지만, 내가 하면 약간 신포도 전략처럼 느껴져서 아직은 금욕과 절제, 이성을 중시하는 핵심 키워드에 집중하려고 한다. 다만 이 내용이 왠지 흥미로워서 발췌했다.

내가 글쓰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훈력이다. 글을 쓰는 행위만큼 이성과 감정을 정제하는 훈련법이 없다고 본다. 글을 쓰고 난 다음, 해당 글을 토대로 말을 할때 정제된 표현이 나온다. 프롬프트를 보면서 읽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을 통해 내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인 정서를 정제하고 또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뜻이다.

이 내용은 내가 기부와 봉사를 시작하면서 공감하게된 내용이다. 기부와 봉사를 하는 이유, 그냥 한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사실 기부와 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거 없다. 나도 하기전까진 왜 기부와 봉사를 이유없이 하는지 몰랐다. 근데 정말 선행은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고 결과다.

"전쟁처럼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 로버트 그린의 명언이 맘에 들어서 고른 내용이다.

사실 인생에 큰 괴로운 사건들로 인해 철학은 커녕 책도 쳐다보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꽤나 길었지만, 결국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 필로소피는 삶의 위로를 준다는 게 크다. 예전에 철학을 탐닉했던 이유는 지적 허영이고, 지금의 나는 그저 철학으로 지혜를 갈구함이다.

배움이란것은 아무래도 책을 통해서도 있지만, 세상을 통해 배워가는 것도 있다고 본다. 배움이 자유를 주고, 자유가 또다른 배움의 길로 인도한다.

세네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지금의 현실을 벗어날 생각만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러나, 어딘가로 떠나기 전에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임을 진다는 것, 내가 그만한 강함과 도덕적 우월이 없다면 할 수 없다.

발라 모굴리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는 언제나 두려움과 동시에 용기를 가져다준다.

죽음을 배워나가는 것도,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죽음이란 종결에 대해 우리의 삶이란 출발점부터 불안으로 채워나갈 이유는 없다.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아포리즘, 마치 앎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에 대해 조언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 다음 자기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반쪽짜리 독서가 된다. 적어도 책에 대한 감상을 쓴다는 것은 "나 읽음" 이고, 이 책에서 다뤄지는 스토아 철학에 대해 알아가기로 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내 삶에 지표로 삼고 행동과 행위에 반영하는 것이 "완독"이라 본다.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은 많았지만, 조금은 모호하기도 했다. 금욕, 절제 이성이란 핵심 키워드는 이해했지만 뭔가 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의 삶의 지표로 스토아철학을 나의 행위와 행동에 반영할만한 매력적인 철학이다. 철학의 매력은 내 삶에 적용 가능한가. 해당 철학으로 내 삶의 생각의 전환을 넘어 행동양식까지 바꿔볼 만 한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사실 견유학파처럼 살고 싶긴 하지만, 스토아 철학과 자유주의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맞지 싶다. 그저 내 햇빛만 막지 말아다오. 내가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을 훈련할지어니.
'책 그리고 흔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짜 사랑하면 서로를 닮게 된다 미러링 효과 (0) | 2025.01.31 |
|---|---|
| 194 나의 임무 하루 한장 니체 아포리즘 (0) | 2025.01.31 |
| 읽고 들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0) | 2025.01.30 |
| 들은 책들 카프카의 변신, 카뮈의 이방인 (0) | 2025.01.29 |
| 읽고 들은 책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0) | 202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