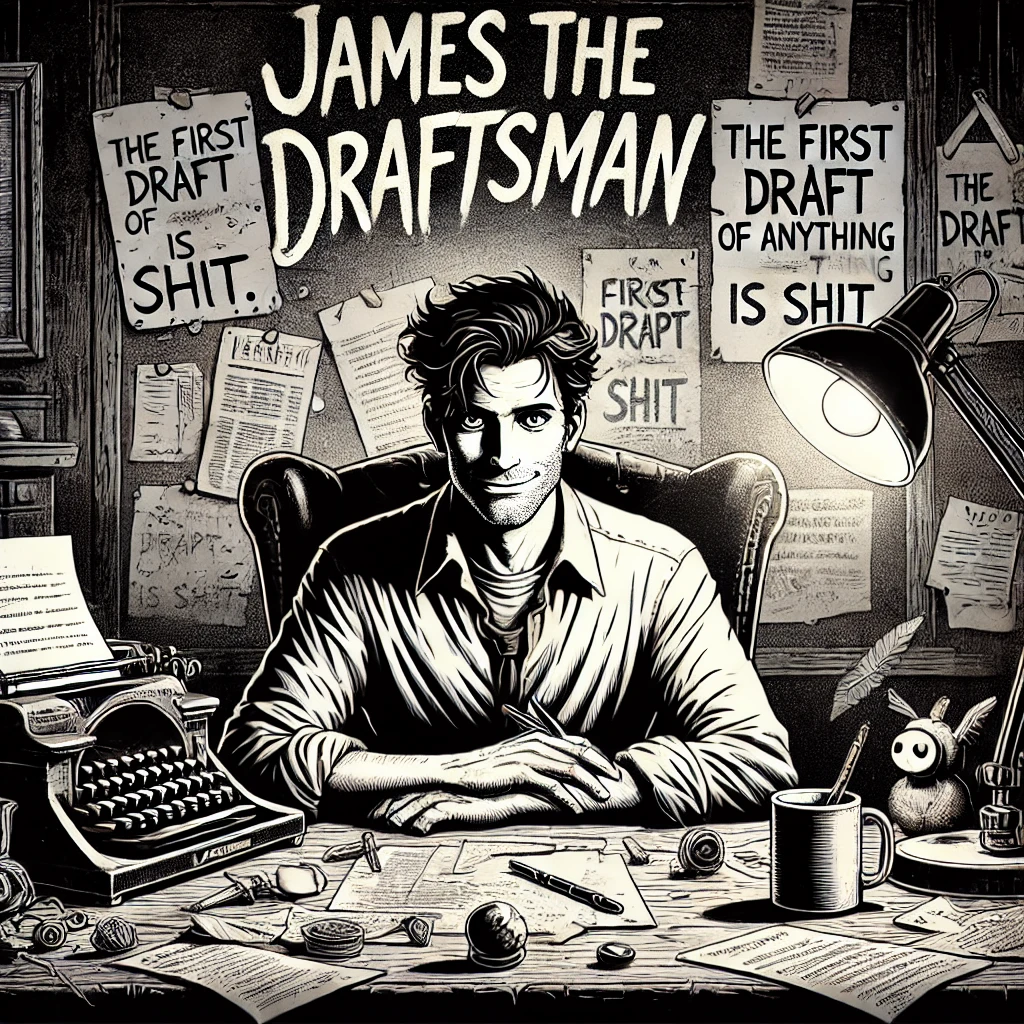서론으로 잠깐 오늘의 뚜벅이 in 제주, 대중교통 여행기를 잠깐 하고자 한다. 원체 밖을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은 볼일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뚜벅이라 버스를 이용하기에 KFC가 있는 사거리, 고산동산 정류장에 가서 볼일을 봤다. 그러고는 다시 노형동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졸았다. 졸지에, 화북까지 가 버렸다. 오랜만에 고등학생 시절 졸다가 집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차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생 시절, 지하철에서 정신 못 차리고 반대편 역을 탔던 기억도 나고, 좋았다. 나름 추억으로 미화하는, 뚜벅이 여행기다.
나는 내 삶의 비극을 희화화하길 좋아했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요즘은 농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그러하다. 원체 삶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가벼운 웃음이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농담을 즐겼다. 가끔은 과하게 농담하거나 희화화하다 보니, 친구들이 자학개그라며 웃곤 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나름 괴리감을 느끼곤 했었다. 그래도 나름 의미부여를 하곤 했다. 남을 비하하면서 웃음을 만드는 이들보다, 나 자신을 낮춰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곤 했다.
농담하기 힘들어진 시점은, 내가 대학생 신분을 포기했을 때다. 아니, 사실 양다리를 걸쳤다. 휴학을 신청하고 호주행 비행기를 탔다. 당연, 가족이나 친구들은 잠깐 호주 생활하다 한국 와서 취업하겠지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인정한다. 비겁하지만, 반은 도망치는 삶, 또 다른 여지는 남겨두는 선택이었다. 회피형 인간의 전형이라고나 할까.

호주에서의 삶은 농담 반, 진담 반의 묘한 삶이었다. 네팔 부부와의 1년여간의 생활은 사뭇 진지함 7할과 농담 3할이었다. 영어로 대화를 해야 했기에, 대체로 농담을 하기는 부족했다. 그래도 많이 치유되었다. 나는 단지 asian 이길래, 그냥 중국인이나 일본인이겠구나 생각했던, 착각이 불러온 축복이라고나 해야 할까. 나중에 네팔 부부이야기는 따로 다룰 예정이다.
뒤이어 마주쳤던 한인 로컬과 워홀러들 사이에서 농담과 공감으로 많이 회복했다. 농담을 과하게 던지며, 다시 나를 내려놓고 남을 웃게 해주는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독'을 듣곤 했다. 호주에서의 생활이 분명 나를 회복해 주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혼자 운전할 때, 많이 듣곤 했다. 어설프게 따라 불러 보기도 했지만, 못 들어주겠더라. 그냥 가사가 좋았다.

캐나다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한다. 캐나다에선 농담보다는 진지했던 삶이 아니었나, 너무 엄격하고 무겁게 살려다가 무너졌던 것은 아닌가 싶다. 아무튼, 나를 호주와 캐나다로 이끌었던 놈(편한 친구라 비하한다)이 나에게 'In to the wild'(2007)라는 논픽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추천했다. 내가 생각난다며, 어떤 조롱을 하려고 하나 싶어서 한번 쓱 훑어봤다.
보기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인 에밀 허쉬랑 키(170cm)는 같네, 일단 해외 떠돌이 인생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 같은 여인은 없었다. 다만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깨달은 것 마냥 떠들어 댔던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한편으로는 반성하기도 한다. 분명 예전에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타인에게 공감하고 연민하는 오만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농담이 어렵다. 희화화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말이다. 과거에 내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공감하고 연민했던 모습을 생각하기 오히려 괴롭다. 그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오만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동정과 연민이 옳다고 믿었던 내가, 지금은 모르겠다.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유보할 수밖에 없다. 정리가 안되기에 조금 급하게 마무리한다.
농담으로 내 삶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를 아는 가까운 이들에게 농담도 다큐가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진지한 말을 던지면, 또 심각해진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늘도 그저 입을 닫고, 귀를 연다. 누군가에게 동정과 연민하려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미덕이 필요하는 말이 있다. 높은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내가, 누굴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을까.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던 나 자신이, 그 자체에서 농담하던 때가 생각난다.
'일상 끄적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우보이 비밥? 은 모르고 alone 만 알아요 (0) | 2022.01.28 |
|---|---|
| Garbage draft, 쓰레기 초고 (0) | 2022.01.27 |
|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110kg에서 63kg까지 (0) | 2022.01.21 |
| 취미는 독서..아니 Youtube 시청 (0) | 2022.01.18 |
| 22/01/05 책 , 그리고 여성 (0)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