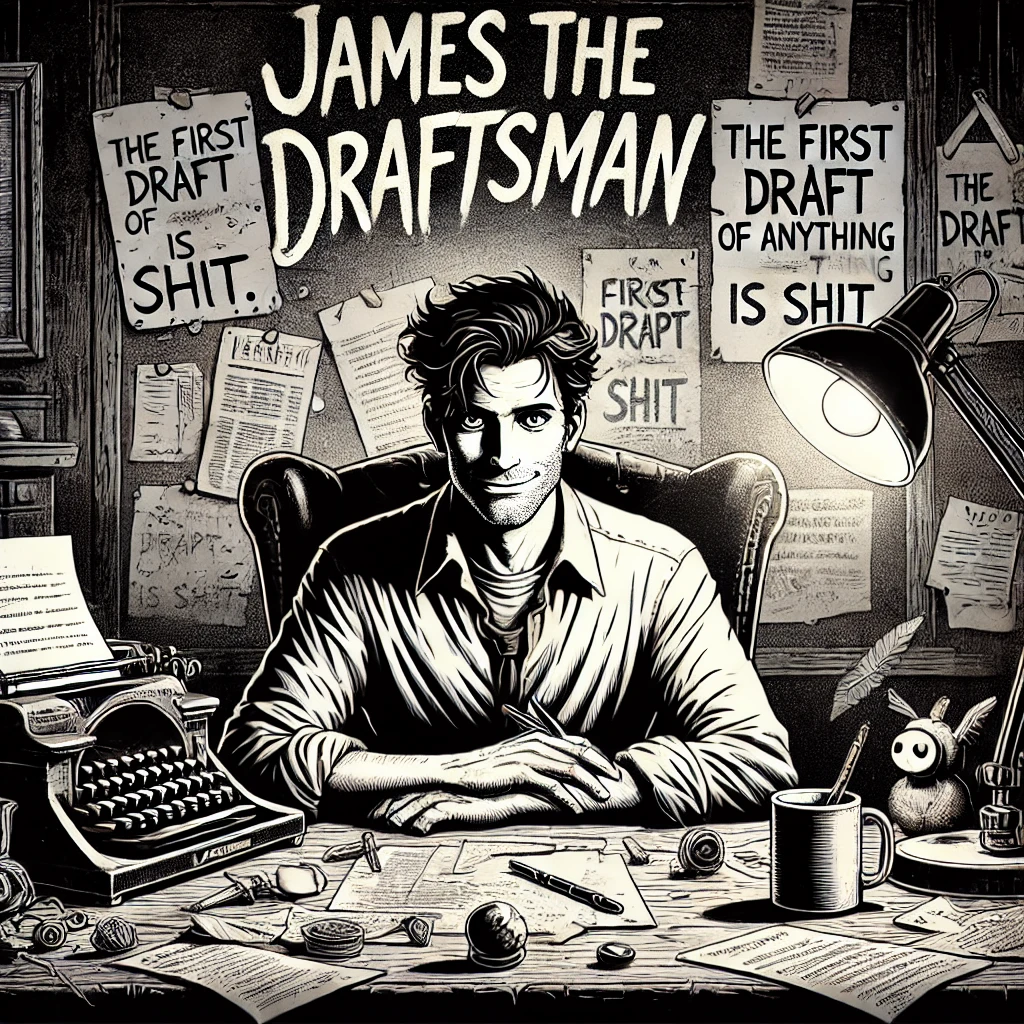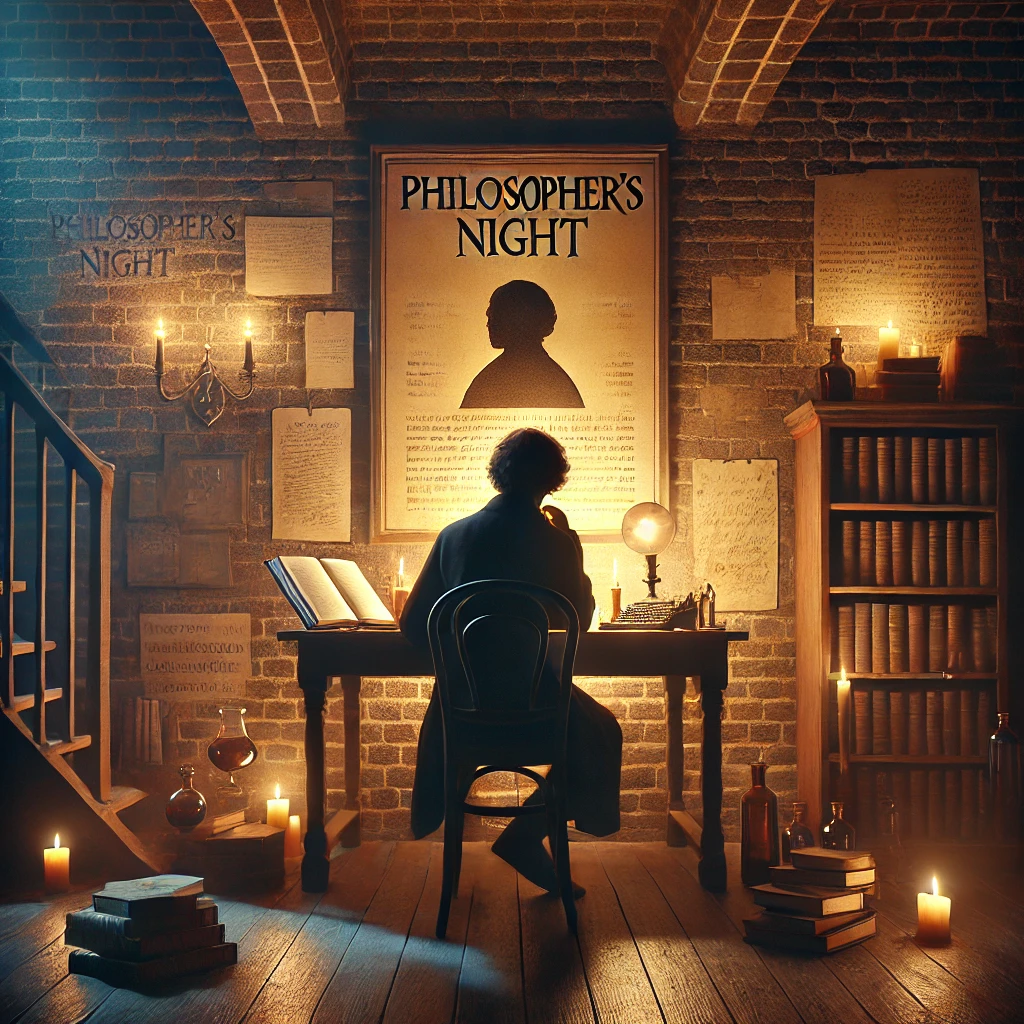
Basement Philosopher’s Night – 오늘의 주제: 고통 (Pain)
고통은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철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왔습니다. 다음은 여러 철학자들의 아포리즘(경구)과 고통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 철학자들의 아포리즘 (Aphorisms on Pain)
1.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
• “고통을 견디는 자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한, 거의 모든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 “He who has a why to live can bear almost any how.”
니체에 철학에는 자기극복이란 메시지가 담겨있다. 위버멘시라는 주체도 자기극복이란 서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란 작품에서 보여주는 자기극복 유형의 주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자기극복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는 이유를 알고 있을 때 발현된다. 그 이유를 알게되면, 영원회귀도 설명이 된다.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적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더라도 견딘다. 그렇게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파티란 표현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고통을 견딜 힘이 생기기에 말할 수 있다.
2.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 “삶은 끊임없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 “Life swings like a pendulum between pain and boredom.”
사실 쇼펜하우어는 니체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염세적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철학자다. 그의 아포리즘은 직관적인 느낌을 줘서 매력이기도 하고, 많은 오해와 논란을 주기도 한다. 위의 아포리즘은 사실 그의 삶과는 어쩌면 먼 이야기 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항상 신경증적일 정도로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고통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지루한 삶에서도 시련과 고통은 찾아오는 인생에 대해 쇼펜하우어가 아포리즘으로 남겼다.
3.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 “고통 없이 강해질 수 없다.”
• “One cannot grow strong without suffering.”
클리셰 적인 아포리즘이라 코멘트할 만 여지가 없다. 허나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결국 인간이 서로간의 약속을 통해 사회를 만든 이유는 사회라는 시스템이 없었을 때에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사회적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부를 만들고 유지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시련과 고통이 있다. 결국 인간이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고, 파기하는 과정 면면에 고통이 수반된다. 허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계약관계,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이 맺어지는 과정이 점차 진보한다. 이것이 어쩌면 실패라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학습되는 강해짐이라 볼 수 있다.
4. 시몬 베유 (Simone Weil)
• “고통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이다.”
• “Pain is almost the only gateway to truth.”
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지만, 인생에서 고통만큼 진리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만한 방법도 없다고 본다. 소위 책상머리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보다 내 인생에 죽을정도로 괴로운, 심지어 나자신을 죽일정도의 고통을 겪고 나면 나름 철학자들이 본 세계를 엿본 정도는 깨닫는다. 물론 퇴행의 과정도 겪지만.
5.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 “고통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너를 괴롭힐 뿐이다.”
• “It is not death or pain that is to be feared, but the fear of pain or death.”
사실 고통을 겪었던 사건은 지나가면 희석이 된다. 실제 우리가 느꼈던 고통은, 그 순간에도 엔돌핀과 같은 마약성 호르몬에 의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 허나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념이다. 고통스런 사건에 따른 충격보다, 그때 내 자신을 자꾸 복기하는 나의 어지러운 상념이 날 괴롭힌다.
6. 에픽테토스 (Epictetus)
•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 “Men are disturbed not by things, but by the view they take of them.”
스토아 학파의 특징이라면, 모든 현상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이성이 관여하는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가히 스토아 학파의 이데올로기라고 볼만하다.
7. 부처 (Buddha)
•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 “Pain is inevitable, but suffering is optional.”
인생은 고통이다.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계속 상념에 담아두면 고통은 괴로움이 된다. 이를 배움으로 승화한다면 나 또한 철학자나 현인들의 발자국 옆에 개발자국 정도는 찍을 수 있겠지.
🔹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고통의 의미
•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가?
• Is pain merely something to be avoided, or is it a necessary part of growth?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고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나에게 달려있다. 어떤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여서, 트라우마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성장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있다. 사실 고통은 직접 겪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까지 견디는지 알 수 있다. 트라우마 수준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고통은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면 모를 일이다. 그 고통이 날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헤매이게 만들지는 경험해봐야 안다.
2. 고통과 존재
• 인간 존재에서 고통은 필연적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Is pain an inevitable part of human existence? If so, why?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과 변수로 이루어진 세계다. 아니면 결정론이나 운명론으로 봐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고통 없는 인생은 무균실이다. 세상은 온갖 병균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무균실에서 자란 인생은 바깥구경은 절대 할 수 없지 않는가.
3. 고통과 윤리
• 도덕적 성장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 Can moral growth be achieved through suffering?
내가 겪은 고통이 윤리적 사유가 거리감이 있더라도, 나는 어떤이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한다. 고통은 옳은 방향에 대한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된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남에게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혹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에게는 공감의 정서를 가저온다. 윤리적으로 모호했던 내가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조금은 윤리적인 인간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4. 고통과 의미
• 니체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면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 Nietzsche said, “If we find meaning in suffering, we can endure it.” Can all suffering be given meaning?
모든, 이란 전제를 달면 왠만한 명제에 오류가 발생한다. 어떤 의미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이를테면 뇌사수준의 고통을 겪어버린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모든" 대신 "왠만한"으로 치환하면 어느정도는 니체의 아포리즘에 힘이 실린다.
"거의 모든"으로 바꾼다면 조금은 니체에 흠뻑 빠진 사람에겐 맞는 말이기도 하고.
5. 고통과 자유
•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필연적이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Schopenhauer argued that while pain is inevitable, our attitude toward it is our choice. How should we approach suffering?
쇼펜하우어와 부처의 아포리즘이 비슷해 보이는데, 고통은 우리에게 변수처럼 찾아오지만 인생의 범위에서는 상수다.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다. 이 부분을 항상 마음과 머리에 새겨둔다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괴로워하기 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에 시간을 쓰지 않을까.
6. 고통과 사회
• 사회는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고통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 Should society aim to minimize pain, or should it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uffering leads to growth?
개인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허나 사회는 개인이 속한 상위 범위이기에, 개개인이 고통을 덜 겪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일종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고통을 제시할 수는 있다. 이것은 예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는 고통을 겪을 개인에게 견딜 수 있는 예비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회복하거나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일조의 케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사회가 붕괴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공동체를 구상하는 집단의 목표다.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세요.
고통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Dum dolor vivit, homo vivit.”
“고통이 살아 있는 한, 인간도 살아 있다.”
고통은 거의 우리 자신을 죽일 것 같이 찾아오지만, 산다. 물론, 누군가는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 더이상 살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살아남은 이들, 나 또한 어깨가 무겁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혹은 보편적인 느낌이 든다. 내가 죽을만큼 힘들었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이 떠오른다. 결국 나와같은 고통에 누군가는 성장하고, 퇴행하고, 살거나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통해 배운다. 나의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이다. 나의 괴로움은 공유되며 공감될 수 있기에 퇴행을 겪었던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한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은 살아있고, 나 또한 숨쉰다.

'일상 끄적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늘이 맑아지는 시기 이기주 언어의 온도 (0) | 2025.02.10 |
|---|---|
| 아재론 - 이성을 "안"만나겠나, "못" 만나는 아재의 삶 (0) | 2025.02.10 |
| 아재론 - 친구가 세상을 떠난지 8년, 아재는 그 친구와 골목에 있다. (0) | 2025.02.08 |
| Just Saying in the Morning 2025-02-07 (0) | 2025.02.07 |
| 아재론 - 인생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X되는 느낌은 알 것 같다고 (0) | 2025.02.05 |